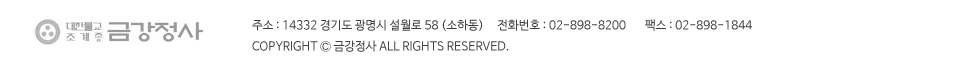2째주 일요법회(6/8, 일)
본문
6월 둘째주 일요법회가 6월8일(일) 석두스님 법문으로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법문에 앞서 보현행자의 서원 회향분을 다함께 합송합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순한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여지이다. "
_ 보현행자의 서원 회향분 中
오늘 일요일 날씨는 본격 여름에 들어서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
법회봉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올립니다.
석두스님의 법문동영상 보기





- 법회후 금강정사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간단 인사나누기.. 도안, 원경거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 오늘 점심공양 준비는 문수2구(명등 월산)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 법회후 전법단 식구들은 가피에서 6월 월례모임을 진행합니다~~`


집이 없는 새는 자유롭다.
총무원 총무국장 석두스님
繫念乖眞(계념괴진)하여 昏沈不好(혼침불호)니라
‘생각에 얽매이면 진실에 어긋나니 혼침도 좋지 아니하니라’
不好勞神(불호노신)에 何用疎親(하용소친)가
‘좋지 않은 것과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에 어찌 멀고 가까움을 사용하겠는가?’
欲趣一乘(욕취일승)인댄 勿惡六塵(물악육진)하라
‘일승을 성취하고자 할진댄 육진을 싫어하지 말지니라’
智者無爲(지자무위)어늘 偶人自縛(우인자박)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묶임이로다’
여기서의 ‘계념’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접할 때 생각으로 먼저 떠올린 것에 일정하게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견해’라고 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하면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의 생각을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나 의견이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혀 반영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라면, 그 생각은 편협된 견해이고 치우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수행은 타인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한 수행을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무리 옳은 판단이고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이나 생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행해 진다면 그 의견이 아무리 옳은 의견이나 판단일지라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진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겐 진실이 다른 누구에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수만큼이나 진실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나머지 것은 모두 진실이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붓다께서도 결코 당신이 깨달은 것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교적 삶의 수행은 열린 사고를 가지려 애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이해의 지평선이 넓어집니다.
‘괴진’이란 진실이나 진리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곧 고집하는 순간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고의 유연함은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이 따로 존재해서 그것을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고하는 순간이 바로 진리이고 진실의 참 모습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성스러운 저 먼 산의 정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한발 다가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주관마저 저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과 사람을 이해하는 자신만의 주관은 갖되, 타인에게 나의 주관을 주입하려 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혼침’이란 주관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려서 자신의 본질도 잊어버리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깨어 있음’을 지향하는 불교적 삶과는 멀리 동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호=혼침이고, 노신=계념입니다. ‘혼침’과 ‘계념’ 모두가 마음공부 하는데 어느 것도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한 것’ 그리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것’ 이 두 가지의 모두가 마음공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가 당착적인 상태입니다.
‘일승(一乘)’사상은 법화경의 ‘회삼귀일(廻三歸一)’ 사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승은 성문승(聲聞僧), 연각승(緣覺僧), 보살승(菩薩僧)을 말합니다.
성문승은 인무아(人無我)만 알고 법무아(法無我)는 모릅니다. 남방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사과(四果)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승(乘)’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행법을 뜻합니다.
‘연각승’은 연기의 이치를 주시하여 깨달음을 추구하여 얻은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보살승’은 자신도 깨달음을 구하고 남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행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승의 단계를 말합니다.
일승사상은 [법화경], [승만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에서 드러난 사상입니다. 대승에서는 삼승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길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즉 불법의 목표는 가지가지의 맛이 하나의 일미(一味)로 귀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근’은 여섯 가지의 맛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낱낱의 창구는 하나의 생각으로 개념화되고, 그것들이 모여 의식을 형성합니다. 개별적인 것들이 총체적인 것으로 모이고, 다시 총체적인 것들이 개별적인 느낌과 생각을 만들어 냅니다. ‘무위의 삶’은 중생의 삶을 버리고 보살의 삶으로 전환할 때 가능해 집니다.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