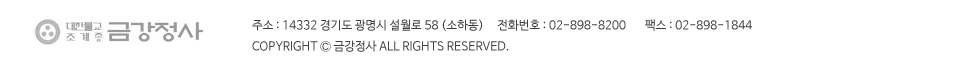백중2재(둘째주 일요법회) :7/14,일
본문
백중 2재일에 200명이 넘는 신도님들이랑 스님들께서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이건만 질서도 잘 지키시고 많이 성숙된 모습 보기가 좋네요. 천수경과 상단불공~정근,축원에 이어 반야심경 후 총무원 기획국장이신 석두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찰 들어오기전에 많이 쓰여 있다는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 놓아라”라는 뜻의 하심(下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이란 법문을 맛깔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순간에 충실하게 살라 하시네요. 좋은 법문 새겨 듣고 백중기도 열심히 정진해 봅시다.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총무원 기획국장 석두스님
多言多慮(다언다려) -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轉不相應(전불상응) - 도리어 서로 응하지 못하게 된다.
불교를 따르는 불자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언어를 대하는 불교의 태도일 것이다. ‘일러라’ 묻고는 대답하면 몽둥이가 날아온다.
사회적 통념의 언어에 대한 생각과 불교에서 말하는 언어에 대한 생각은 사뭇 다르다. 그래서 불교에 친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조사 스님들의 어법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수산성념 선사가 죽비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대중들이여,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죽비라는 모습에 걸리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죽비 아니라는 모습에 걸리게 된다.“
이에 대해 무문 혜개선사가 묻는다.
“죽비라 부르면 집착이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하니
말이 있어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된다.“
“속히 말해보라”
“속히 말해보라”
대답해도 틀리고 대답하지 안 해도 틀리다 하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우리는 단정 짓는 삶에 익숙해 있다.
그래야 분별가능하고 인식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철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분별과 인식을
문제 삼는다.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인식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인간의 인식은 육근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진 정보의 통합이다.
눈을 색과 모양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
죽비는 불교의 문화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진 무엇이다. 막대기라 해도 무방하고, 때로는 등을 두드리는 용도의 것일 수도 있다. 정해진 바는 없다. 대상을 구별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쪽에서 바라본 결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불교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단지 죽비일 뿐이다.
그럼 죽비인가? 몽둥이인가?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지는 모습대로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인식은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근의 감각기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1차로 오염되고, 기억의 저장소라 할 수 있는 육내입처에 의해 조작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 진술되는 내용이 다른 것은 과거의 기억이 욕망에 의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 기억들이 사실인냥 착각한다.
투영된 사물이 오염되고 기억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열려있는 사고를 할 것을 강조한다.
육조단경에서도 無念無宗(무념무종), 無相爲體(무상위체), 無主無本(무주무본)을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는다.
생각이 많을수록 어긋날 가능성이 높고, 보는 것이 많을수록 선입감만 높아질 수 있으며, 생각과 태도가 고정되어 있을수록 불평과 갈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보같이 사는 것이 현자의 삶은 아닐까?
옛날의 어머니들이 고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의 인고의 시간을 감내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아마 옛 어머니들은 반도인(半道人)들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