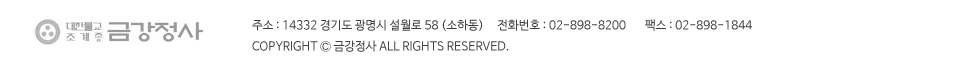6월 2째주 일요법회 봉행(6/9,일)
본문
비온뒤의 쨍한 하늘 적당한 바람까지 살랑이는 오늘은 둘째주 일요법회일 입니다.
봉은사 교무국장에서 총무원 기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석두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성철스님께서 종정으로 추대 되실때 내린 법어로 유명해 진 글귀를 제목으로 법문을 해 주십니다. 항상 중도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는걸 강조 하십니다. 원래 없는걸 우리들의 분별심으로 양극을 만든것이니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반대쪽이 있게 마련이니 양 극단을 떠나 그 무엇도 분별하지 말라 하십니다. 참 쉽고도 어렵지만 우리는 꼭 이분법적으로 뭔가를 구분하는 습성들을 고치는 노력들을 해야 겠습니다.

- 법문하시는 석두스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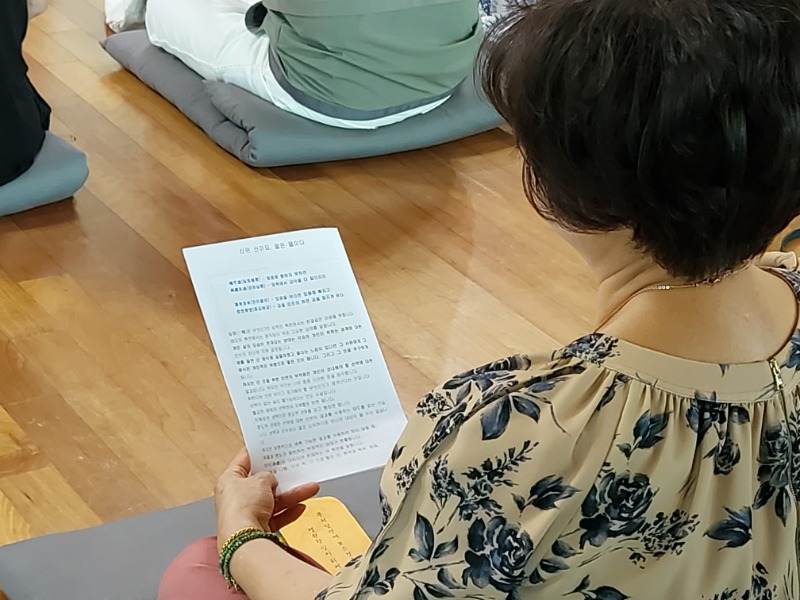

- 집전 법등거사님,ppt 반야향, 사회 지승거사님 -

- 발원문 향화심(황순덕) -

- 법회 참석하신 관음구 1,2법등 가족들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총무원 기획국장 석두스님
日種不通(일종불통) - 일종에 통하지 못하면
兩處失通(양처실통) - 양쪽에서 공덕을 다 잃으리라
遣有沒有(견유몰유) -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從空背空(종공배공) - 공을 따르려 하면 공을 등지게 된다.
일종(一種)은 무엇인가? 심적인 측면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태도의 측면에서는 움직임이 적은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 삶의 모습이 전개되는 양태는 각자의 개인이 취하는 경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단 음식에 길들여졌고 좋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음식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것을 취한 인연의 부작용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종종 이러한 점을 망각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할 무엇인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적 해법은 선택하되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중도적 견해를 갖고 행하면 됩니다.
중도적 견해란 선택에 대한 인연의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선택과 치우침이 결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수용하려 하지 않을 때,
좌절과 분노가 동반하는 부정적인 양태가 분출됩니다.
양처(兩處)란 대립되어 존재하는 양 측면을 말합니다.
좋음과 나쁨, 미와 추, 긴 것과 짧은 것, 흰색과 백색, 등등...
언어적으로 대립되어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열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함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통(失通)- 통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쪽으로 치우침보다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유연한 것은 양 변을 포용하는 것이지, 주체적이지 못한 방랑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지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양 변을 초극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직선적인 사고는 알 수 없는 극으로 치달리지만, 선형적인 사고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한 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遣有沒有(견유몰유)- 있음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유무(有無)의 견해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존재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무존재가 마치 있는 듯한 착각을 무의식적으로 주게 됩니다. 하나를 세우면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 없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서운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게 됩니다.
從空背空(종공배공)- 공(空)은 존재의 실상입니다.
불자라고 따를 것을 주장할 것도 없고, 불자가 아니라고 배격할 것도 없습니다. 주장해도 어긋난 것이고, 배격해도 어긋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실상이지, 언어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옛 고인들의 생생한 법음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