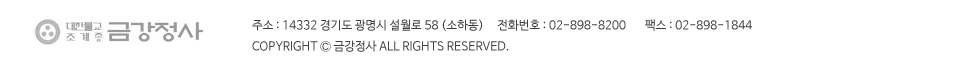갑진년 첫 호법법회(1.3/수)
본문
아침부터 오락가락하는 싸락 눈이 내리는 오늘은 갑진년 첫 호법법회일 입니다.
갈수록 호법법회일에 신도가 줄어 걱정인데 벽암 지홍스님의 법문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150여년전 스리랑카에 유럽의 침공으로 440여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불교탄압을 받아 거의 황폐화 되었던 역사가 우리의 조선시대 불교 탄압이랑 닮은점이 있네요. 하지만 전 생애를 바쳐 스리랑카의 독립을 위해 국민 계몽운동과 함께 불교 부흥을 위해 노력한 한 스님과 미국인 대령의 노력으로 오늘의 스리랑카 불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법문에 점점 신도가 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우리도 호법을 위해 법회에라도 빠지지 않게 참석하시길 바래 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탄압과 호법을 위한 노력
벽암 지홍스님
스리랑카는 B.C 3세기경 인도의 아쇼카 대왕에 의해 불교가 전파된 이래 1500년간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유럽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침공을 차례로 받아 그들의 손에 차례차례 넘겨지게 되면서 스리랑카는 이들 국가로부터 440년간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된 기독교에 의해 과거의 찬란했던 불교문화와 전통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짓밟히게 된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스리랑카의 문화와 정신적 구심점인 불교를 단절시키기 위해 불교 신자를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압박했다. 개종을 거부한 국민들을 처참하게 고문하고 사원을 파괴했으며, 스님들을 무참히 죽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불교가 조선시대 유교에 의해 짓밟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 불교는 계를 설할 전계사스님이 없어져 가장 중요한 승가의 법맥이 단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70년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와 헨리 스탤 올코트(미국인) 대령이였다.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는 전 생애를 바쳐 스리랑카의 독립을 위해 국민 계몽운동과 함께 불교 부흥 운동을 전개하여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을 되살리고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다르마팔라는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지방 토호들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불교 성지를 회복하고 인도 땅에 불법을 재건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워 범세계적 불교기구이며 자선단체인 마하보디 협회와 세계적 불교잡지 마하보디 저널을 창설하여 성지 회복의 기금을 모으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카스트 제도로 피폐된 인도와 스리랑카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실업학교와 불교 교육기관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인물로는 미국인 올코트 대령은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스리랑카에서 불교 부흥운동을 하고 있던 모훗띠와떼 구라난다 스님과 기독교 성직자들간의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대 토론기사를 읽고 감동하여 스리랑카로 건너오게 된 인물이다. 올코트 대령은 스리랑카에 건너와 불교신지협회를 창립하고 불교학교를 설립하여 스리랑카의 불교학문에 부흥을 가져오게 했다. 헨리 스탤 올코트 대령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기를 디자인한 인물로 알려져있는데, 스리랑카로 넘어와 불교 부흥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스리랑카 불교가 유지될 수 있게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올코트 대령의 운동에 힘입어 스리랑카 내의 불교학문의 부흥을 위해 1872년에 콜롬보에 새워진 위드요보다야 오리엔탈 대학과 1873년 케란니야에 세워진 위드야랑카라 대학을 나온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팔리어 경전의 보급을 위한 책들을 발간하였다. 이들은 팔리어 서적뿐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스리랑카어 등으로 경전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팔리어 경전을 읽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팔리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한때 스리랑카는 불교의 법맥이 단절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펼치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스리랑카의 불교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호법과 전법행자들의 노력이야말로 식민역사를 극복하고 스리랑카가 여전히 찬란한 법등의 나라로 빛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법의 보전을 위해" 구전하던 경.율.론 삼장을 필사(筆寫)하다.
대장로와 싱할라(스리랑카)의 지도자들은 미래의 불교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왕은 불교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역경(逆境)의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부처님,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입을 통해 구전해 온 삼장(三藏)의 구전(口傳) 전통을 지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 비참한 기간동안 스리랑카 승가의 첫째 걱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래를 위해 보전하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위급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 대장로 스님들은 긴 안목으로 지방 수령의 비호 아래, 마딸레(Matale)의 알루위하라(Aluvihara)에 모여서 "정법의 보전을 위해" 주석서를 포함한 경.율.론 삼장 전체를 필사(筆寫)했다.
이것이 불교사에 있어서 최초로 경.율.론 삼장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전해진 팔리삼장은 이러한 스리랑카 불교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세상에 나온 것이다. 만일 이때 팔리삼장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남전대장경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불교도들은 팔리삼장을 필사해 전승해 준 스리랑카 불교의 스님들에게 정신적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