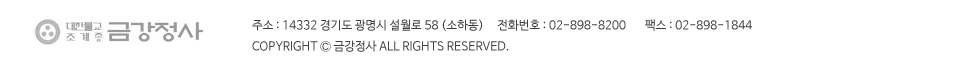10월 명사초청법회 및 싱잉볼명상 (10/19,일)
본문
이번달 10월 3째주 일요법회는 제3회 금강위크 행사일환으로 진행되는
3회차 명사초청법회 및 싱잉볼 명상으로 일요일을 장엄합니다.
오늘 일요법회는 원제스님(김천 수도암 수좌)의 "홀연히 깨어나다"의
주제법문을 말씀주십니다.
스님의 법문동영상은 금강정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회이후 원제스님의 사인회 및 지안선생님의 싱잉볼 명상프로그램까지
대중들의 호응속에서 금강위크 행사를 이어갑니다.
항상 법회의 원만봉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기에 모든일들이 술술술
흘러갑니다.
오늘 법회 사회는 지승거사님께서, 집전은 청여거사님께서, ppt봉사는 여래향보살님께서..
그리고 발원문 낭독은 신도님들을 대신해서 문수1구 자성화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셨네요.
바라밀합창단의 "밝은달" 음성공양과 점섬공양 준비는 문수1구(명등 청정위) 식구들이
국수공양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밖에서는 차량운행과 주차봉사로 템플스테이 지원팀 식구들이 함께하고요.
가피봉사도 웃음꽃으로 신도들을 맞이합니다..
모두모두의 원력으로 금강정사를 만들어갑니다.. ~~~~
아참... 금강정사 중창불사의 원만성취도 지극한 정성기울여 발원합니다..^^











‘홀연히 깨어나다’
김천 수도암 원제스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부처이고 그대로 구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무명과 번뇌가 생겨나 부처의 자리를 벗어나서 중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대승기신론』에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에 쓰이는 단어가 ‘홀연(忽然)’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무명의 근거를 두고 무시무명(無始無明)이라 표현합니다. 곧 시작이 없는 무명이란 뜻인데, 그 무명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홀연이란 그 시원(始原)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무명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근원을 포착할 수 없기에 홀연이란 또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이라면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원을 알고 싶어합니다.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되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앎과 납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생에게, 홀연은 참으로 불친절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문제의 근원은 홀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연히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밝히지 못할 뿐입니다. 인류가 아직 밝히지 못한 하늘의 일들이 역사의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요?
홀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실 홀연에는 그 어떤 잘못도 없고 의문의 여지 또한 없습니다. 구름이 홀연히 일어나다가 또한 홀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홀연은 그 모든 생멸의 자연스런 근거처럼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도 오온(五蘊)이 홀연히 화합되어 연기하는 인연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相)을 가지는 중생은 이러한 ‘나’를 두고 강력한 중심으로 상정한다거나 실체를 지닌 존재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주체, 중심, 실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아의 진리나 홀연은 자기 실체화의 관념으로부터 탈피한다거나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무아와 홀연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체를 가지는 상태로서의 ‘나’는 결코 실체가 없는 진리나 홀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외국인 수행자가 법륜스님께 즉문즉설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아(無我)를 경험할 수 있는가요?” 이 질문을 들은 후 저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그런 ‘나’를 가지고는 ‘나없음(무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실체를 가지고, 실체가 없는 ‘나없음’이라는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실체의 그물이 허공을 붙잡으려 한다거나, 실체의 횃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는 시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없음’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체로서의 ‘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눈앞이라는 실체없음과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온갖 진리가 오갈 수 있는 ‘통로’로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방하착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성현들께서는 진리는 계합(契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실체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진리가 자유롭게 오가는 ‘통로’가 될 적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오만 경계의 일들이 이윽고 낱낱의 생생한 진리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진정으로 성불하는 소식이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곧장 들어가는 일입니다.
나라는 작은 중심에서 벗어나, 중심 없는 중심으로서 이 커다란 전체로 안목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생생하고 명백한 답으로서 홀연히 펼쳐질 것입니다. 홀연은 애초부터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납득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 가없는 전체에서 펼쳐지는 자유의 근거로 있어왔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