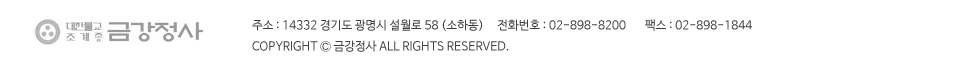6월 문화답사(6/8,목)
본문
목경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6월 문화답사반 순례가
6월8일(목) 43명의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완주소재 송광사 및 위봉사를 다녀오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성 한옥마을에서의 맛난 점심도 함께하며 좋은날, 좋은 도반들과
신심나는 하루를 보냈네요..
여전히 친절하게 문화답사를 이끌어주시는 목경찬교수님의 해맑음은
오늘도 이어지네요...^^
송광사, 위봉사를 알아보는 시간.... 소개글과 사진소식 함께하세요~~~











1. 추줄산(崷崒山) 위봉사(威鳳寺)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2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
위봉사 창건 및 연혁
위봉사가 자리한 추줄산은 주줄산(珠茁山)으로도 불렸으며, 지금은 위봉산이라 널리 불린다.
이 절은 604년(무왕 5)에 서암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극락전중건기(極樂殿重建記)>>(1868년)에 의하면, 창건연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신라 말 최용각이 이곳에 와서 보니 세 마리의 봉황새가 절터를 에워싸고 싸움을 하므로 위봉사(圍鳳寺)라 하였다. 1359년(공민왕 8)에는 나옹스님이 이 절의 주위가 처음 보는 경승지임을 알고 크게 중창하였다. 이때 28동이었고 암자도 10동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다. 고려 시대의 위봉사(圍鳳寺)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위봉사(威鳳寺)로 바뀌었다.
위봉사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찰이었다. 조선총독부가 30본말사법을 시행할 때(1911년), 위봉사는 전북 일원의 46개 사찰을 관할하는 본사의 위상을 갖추고 있을 정도였다.
이후 각종 화재로 수난을 당하면서 거의 모든 전각이 없어졌다가 근래 다시 중창 불사를 하였다.
1990년에 위봉선원을 짓고 삼성각을 보수하였다. 1991년에는 나한전을 중건하고 일주문을 세웠다. 1994년에는 극락전을 건립하여 아미타여래상을 봉안하였으며, 2000년에는 범종각을 지었다.
성보문화재
보광명전(普光明殿)과 극락전·관음전·나한전·삼성각·위봉선원·나월당·일주문·사천왕문·봉서루(지장전)·종각·요사채가 있다.
보광명전
(보물로 지정)
불단에는 석가여래와 문수보살·보현보살·관음보살·지장보살이 자리한다. 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은 1989년 도난되었다가 2016년 되찾았다. 내부의 천개(天蓋)가 정교하고, 거대한 후불탱화가 있다. 뒷벽에는 높이 3m 정도의 인자하고 아름다운 백의관음보살이 그려져 있다.
요사채
(전북 유형문화재 제69호)
1806년 건축, 아자형(亞字形)이다.
2. 종남산(終南山) 송광사(松廣寺)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대흥리 569-2)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
송광사 창건 및 연혁
완주 송광사는 종남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성보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평지형 가람이다.
창건 시기는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우선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종남산 남쪽에 영험 있는 샘물이 솟아나서 그 옆에 절을 짓고 백련사라고 했다. 이후 보조 체징선사(804~880)가 설악산 억성사에서 수행하다 선법을 구하려 중국에 유학 가던 길에 백련사가 영험 도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귀국해서도 가지산 보림사와 종남산 백련사에 번갈아 거주하면서 도의국사의 선법으로 널리 교화했다. 이때 체징선사는 백련사를 송광사로 개칭했다.
<<송광사사적비>>(1636년)에 의하면, 보조국사 지눌스님(1158∼1210)이 점지하였다가 1622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7칸 중층의 대웅전을 건립함으로써 창건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으로 사액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여러 법당이 신축 또는 중건되었다.
* 체징스님과 지눌스님이 ‘보조’라는 동일한 호를 지니고 있으로 신라 체징스님이 창건 또는 점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 시대 창건설은 뚜렷한 문헌 근거가 없고, 사찰 일대에는 신라,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성보문화재
일주문(一柱門)
(1971년 12월 2일 전북 유형문화재 제4호 지정)
금강문(金剛門)
(1999년 7월 9일 전북 유형문화재 제173호 지정)
금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를 모시는 문이다. 중앙 통로 좌우로 두 명의 금강역사와 동자 모습의 사자를 탄 문수보살상과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천왕문(天王門)
천왕문은 사천왕을 모시는 곳이다.
송광사는 사천왕을 모신 곳을 천왕문으로 하지 않고 천왕전으로 건축하여 이곳은 여닫는 문으로 되어있다. 현판도 사찰에 들어오는 쪽에는 천왕문으로, 대웅전 쪽에는 천왕전으로 현판을 달았다.
서방 광목천왕상 왼쪽 머리끝 뒷면에는 조선 인조 27년(1649)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는 글이 있으며, 왼손에 얹어놓은 보탑 밑면에는 정조 10년(1786)에 새로이 보탑을 만들어 봉안한 기록이 있다.
종루(鐘樓)
(1996년 5월 29일 보물 지정)
종루는 범종(梵鐘)·법고(法鼓)·목어(木魚)·운판(雲板) 등 사찰에서 의식 때 사용하는 불전사물을 봉안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종루나 종각이 사각형으로 지어지는데, 송광사 종루는 보궁(寶宮)에 주로 채택되는 십자형[아(亞)자형]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1814년 혹은 1857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루에 걸린 범종·법고·목어·운판 등은 1977년에 조성된 것이고, 바닥에 놓인 범종은 1716년(숙종 42)에 무등산 증심사에서 조성되어 1769년(영조 45)에 중수된 것이다.
대웅전(大雄殿)
(1996년 5월29일 보물 지정)
송광사 대웅전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석가여래·약사여래·아미타여래 즉 삼세불상(三世佛像)이 봉안되어 있다.
불단에는 왕· 왕비· 세자의 축원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조선 후기 최대의 목공예품인 삼전패(三殿牌)가 있다.
<<송광사사적기>>에 의하면, 초창 당시인 1622년에는 2층 건물이었다. 1857년에 건물이 기울어졌는데 중수되면서 단층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웅전 현판의 글씨는 선조의 아들인 의창군(義昌君)이 썼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현판 역시 의창군의 글씨여서 두 사찰과 의창군 그리고 벽암각성대사(1575∼1660)의 관계가 주목된다.
나한전(羅漢殿)
(1999년 7월 9일 전북 유형문화재 제172호 지정)
나한전은 깨달은 성자인 아라한(나한)을 모신 전각이다. 송광사 나한전에는 석가삼존상(제화갈라보살, 석가여래, 미륵보살)과 16나한 및 500나한을 모시고 있다. 오백나한전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금강역사, 동자상, 사자상 등도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 나한전은 1656년(효종7)에 벽암각성대사가 송광사를 중창할 당시 건립되었으며, 1934년 해광스님이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송광사 나한전은 영험한 나한기도처로 유명하다.
참고 : 완주 송광사 홈페이지 http://songgwangsa.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