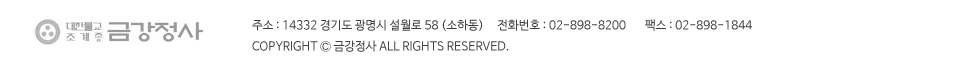3월 포살법회 및 열반재일 기념법회(3/5,일)
본문
완연한 봄날씨인 오늘 3월 첫째주 일요일로 포살법회와 열반재일 기념법회로
법당이 가득차 보기가 좋습니다.
포살 후 스님의 법문을 통해 열반재일을 맞아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불자가 되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호법이라고 강조 하십니다.
이어 수도권, 하안구명등과 보현구,문수구 금강 임원부촉을 하면서 법회가 마무리 됩니다.

-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 법문 하시는 벽암 지홍스님 -


- 포살하는 모습들-

- 바라밀 합창단의 합창곡 "바람" -

- 하안구명등 정견행, 수도권구명등 대안성 -

- 보현구3법등 금강 보정성, 문수2구 2법등 금강 견성행 -

- 열반재일 발원문 지승거사님 -

- 공양봉사 문수1구 -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
벽암 지홍스님
“오늘은 불기 2567년 음력 2월 15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재일입니다.
열반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 번째 의미는 모든 고뇌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을 풀이하자면, 모든 고뇌가 소멸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적멸’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완전한 고요함에 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열반, 즉 ‘반열반에 드셨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모든 고뇌가 사라진 경지에 이르셨다고 해서 ‘열반을 증득하셨다’라고 하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고 해서 ‘반열반에 드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경전 중에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해가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열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하루하루 생활이 자세하게 기록된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 출발점은 당시 인도 최대의 제국인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그라하’, 즉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밖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영축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으로 열반경이 시작됩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의 수많은 자비의 행적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비의 행적들을 남기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에 도착합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뒤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가셔서 열반에 드십니다. 사라나무는 미루나무처럼 위로 키만 크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와 나무 사이의 그늘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두 그루 사이에 드리워진 그늘에 가사를 벗어서 네 겹으로 접어 깔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 다리는 남쪽을 향하게 누우신 뒤 ‘오늘 저녁에 여기서 열반에 들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음력 2월 15일입니다.
그때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위로하는 설법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여래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육신은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너희 곁에 남아 있으리라.”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의 가르침인 계戒를 스승으로 삼아라. 계를 지니고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것과 같고, 비록 나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사념처에 의지하라. 사념처란 첫째, 관신부정觀身不淨, 즉 몸이라는 것은 청정한 것이 아니다. 둘째, 관수시고觀受是苦, 즉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괴로움이다. 셋째, 관심무상觀心無常, 즉 마음이라는 것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써 무상한 것이다. 넷째, 관법무아觀法無我, 즉 모든 존재는 실아(實我)가 없다. 이렇게 신.수.심.법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관하는 것이 명상이고 위빠싸나이니라.”
아난존자는 또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지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공양을 올려야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지에 공양하라.”하셨습니다. 네 가지는 첫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둘째, 병든 자에게 약을 공양해서 병을 낫게 하고 셋째,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며 넷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자를 잘 외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부처님의 자비행이 있고, 보살행이 있고, 불자들의 신행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와 전법행을 더해서 만든 것이 호법입니다. ‘배고픈 자는 먹어야 하고, 병든 자는 치료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하고, 불자는 전법을 해야 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굶고, 병드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제외하고 가난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징표가 바로 제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제 아이를 공부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구의 아이든 아이들은 모두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대성지(룸비니,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를 예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