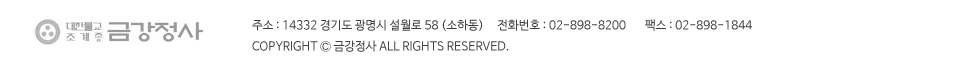계묘년 입춘3일기도 입재 봉행(2/2, 목)
본문
유난히도 눈도 많이오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려나 봅니다.
오늘이 입춘(立春)3일기도 입재일 입니다. 꽁꽁 얼었던 땅들도 봄을 맞이하는 땅의 따뜻한 기운을 보내 옵니다. 80여명의 신도님들과 다섯분의 스님들의 기도 목소리가 모든 삼재가 범접 못하게 우렁찹니다.
벽암 지홍 큰스님께서 법문을 통해 불자의 제일가는 삼재풀이란 계율수행과 선행을 실천하는 보살행이 어느 방편 부적보다 최고의 부적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에 봉사하는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강조 하십니다. 금강 불자 여러분!
든든한 부처님을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삼재팔난 스스로 물리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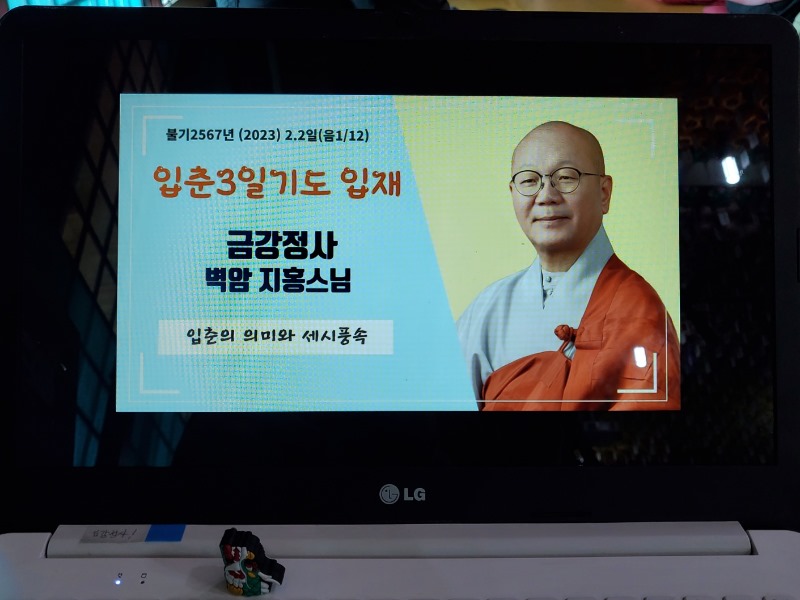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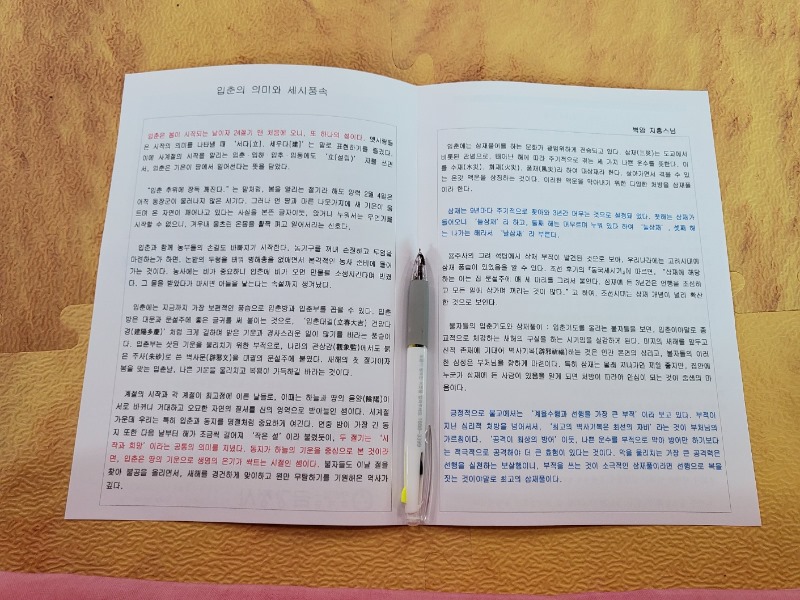

- 맛있는 공양봉사 해주신 광명구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입춘의 의미와 세시풍속
벽암 지홍스님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24절기 맨 처음에 오니, 또 하나의 설이다. 옛사람들은 시작의 의미를 나타낼 때 ‘서다[立]. 세우다[建]’는 말로 표현하기를 즐겼다. 이에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하・입추・입동에도 ‘立(설립)’ 자를 쓰면서, 입춘은 기온이 땅에서 일어선다는 뜻을 담았다.
“입춘 추위에 장독 깨진다.”는 말처럼, 봄을 알리는 절기라 해도 양력 2월 4일은 아직 동장군이 물러나지 않은 시기다. 그러나 언 땅과 마른 나뭇가지에 새 기운이 움트며 온 자연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뜬 글자이듯, 앉거나 누워서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으니, 겨우내 움츠린 온몸을 활짝 펴고 일어서라는 신호다.
입춘과 함께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고 두엄을 마련하는가 하면, 논밭의 두렁을 태워 병해충을 없애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농사에는 비가 중요하니 입춘에 비가 오면 만물을 소생시킨다며 반겼다. 그 물을 받았다가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까지 생겨났다.
입춘에는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인 풍습으로 입춘방과 입춘부를 꼽을 수 있다. 입춘방은 대문과 문설주에 좋은 글귀를 써 붙이는 것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처럼 크게 길하며 밝은 기운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풍습이다. 입춘부는 삿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부적으로, 나라의 관상감(觀象監)에서도 붉은 주사(朱砂)로 쓴 벽사문(辟邪文)을 대궐의 문설주에 붙였다. 새해의 첫 절기이자 봄을 맞는 입춘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됨이 가득하길 바라는 것이다.
계절의 시작과 각 계절이 최고점에 이른 날들로, 이때는 하늘과 땅의 음양(陰陽)이 서로 바뀌니 거대하고 오묘한 자연의 질서를 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사계절 가운데 우리는 특히 입춘과 동지를 명절처럼 중요하게 여긴다.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 또한 다음 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져 ‘작은 설’이라 불렸듯이, 두 절기는 ‘시작과 희망’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지녔다. 동지가 하늘의 기운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면, 입춘은 땅의 기운으로 생명의 온기가 싹트는 시절인 셈이다. 불자들도 이날 절을 찾아 불공을 올리면서,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고 원만 무탈하기를 기원해온 역사가 깊다.
입춘에는 삼재풀이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삼재(三災)는 도교에서 비롯된 관념으로, 태어난 해에 따라 주기적으로 겪는 세 가지 나쁜 운수를 뜻한다. 이를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라 하여 대삼재라 한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액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액운을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삼재풀이라 한다.
삼재는 9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3년간 머무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첫해는 삼재가 들어오니 ‘들삼재’라 하고, 둘째 해는 머무르며 누워 있다 하여 ‘눌삼재’, 셋째 해는 나가는 해라서 ‘날삼재’라 부른다.
용주사의 고려 석탑에서 삼재 부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삼재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삼재에 해당하는 이는 집 문설주에 매 세 마리를 그려서 붙인다. 삼재에 든 3년간은 언행을 조심하고 모든 일에 삼가며 꺼리는 것이 많다.”고 하여, 조선시대는 삼재 개념이 널리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불자들의 입춘기도와 삼재풀이 : 입춘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을 보면, 입춘이야말로 종교적으로 체감하는 새해의 구실을 하는 시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미지의 새해를 앞두고 신적 존재에 기대어 벽사기복(辟邪祈福)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심리고, 불자들의 이러한 심성은 부처님을 향하게 마련이다. 특히 삼재는 몰래 지나가면 제일 좋지만, 집안에 누군가 삼재에 든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처방이 따라야 안심이 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긍정적으로 불교에서는 ‘계율수행과 선행을 가장 큰 부적’이라 보고 있다. 부적이 지닌 심리적 처방을 넘어서서, ‘최고의 벽사기복은 최선의 자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듯, 나쁜 운수를 부적으로 막아 방어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더 큰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악을 물리치는 가장 큰 공격력은 선행을 실천하는 보살행이니, 부적을 쓰는 것이 소극적인 삼재풀이라면 선행으로 복을 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삼재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