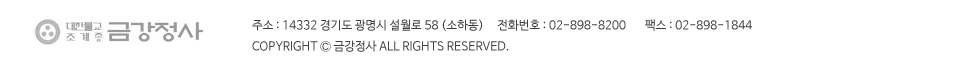셋째주 일요법회 및 정월특별천도재 회향봉행(2/19.일)
본문
지난주 정초성지순례로 인해 한주 쉬고 맞는 셋째주 일요법회일이며,



- 바라춤을 추시는 성일,묘련스님 -



- 짧은 법문을 해 주시는 석두스님 -



- 살풀이춤을 추시는 비구니 묘련스님 -

- 인로왕보살을 시작으로 번이 앞장섭니다 -

- 뒤 이어 스님들께서 소전대로 향하십니다 -

- 봉송의식 -

- 소전대에서 활활 타 오르는 금전,은전,위패들 -
인식의 방법을 바꾸면 삶의 질이 바뀐다.
봉은사 포교국장 석두스님
붓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하신 분이다. 그는 삶과 감각적인 쾌락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유혹이고
둘째, 위험이고
셋째, 여윔이다.
유혹은 만족과 즐김을 수반하고, 위험에는 불만과 재난이 따른다.
여윔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말한다.
유쾌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매혹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보는 것을 즐기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이것이 유혹이다.
이것은 경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유혹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매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변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볼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향락을 박탈당했을 때에는 슬픔에 잠기게 된다. 당신은 이성을 잃고 균형을 잃어 아주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이때에는 나쁘고 불만족스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것이 위험이다. 이것도 역시 경험적인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초연해서 그 사람에게 매혹 당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자유롭고
해탈된 구출의 상태이다. 이것이 여윔이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모든 감각적인 향락에서의 진실이다.
삶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즐거움과 괴로움에서의 출리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해탈이 가능하다.
[붓다] “수행자여, 수행자는 감각적 쾌락의 그 유혹을 유혹으로, 그 위험을 위험으로, 그 여윔을 여윔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분명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거나 그렇게 실천하는 자로 하여금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분명히 알도록 할 수 없다.”
붓다가 정의한 괴로움의 개념을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
1, 고통의 괴로움은 일반적인 고통에서 오는 괴로움
2, 변화의 괴로움은 영원히 지속하지 않고 변화에 의한 괴로움
3, 형성의 괴로움은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에 의한 괴로움이다.
앞의 1,2번은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괴로움이다. 하지만 형성의 괴로움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측면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존재, 개체, 자아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불교철학에 의하면 존재, 개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오온)로 구성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적, 정신적인 힘 또는 에너지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붓다] “이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 바로 괴로움이다.”
불교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정신은 서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초기 불교에서의 마음이란 단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이다. 그것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조정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시각기관과 마음이 기능상 다른 점은 눈은 빛과 보이는 물질을 감지하는데 비해 마음은 관념과 생각의 세계와 정신적인 대상을 감지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감관은 서로 다른 감각으로 세계의 다른 측면을 감지한다.
육체적인 감각기관은 각기 거기에 대응하는 세계를 각기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은 세계의 일부분만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과 관념 또한 역시 세계의 일부분만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감각은 체험된 세계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면 빛깔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으며, 소리에 의한 분석이나 다른 감각에 의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세상의 일부를 형성하는 관념이나 생각은 육체적인 경험에 의해서 산출되고 조건 지어지며 마음에 의해 수용되어 마음은 사물이나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마음이나 정신은 시각기관이나 청각기관과 같은 감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마음이나 정신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바꾸면 인식의 변화가 초래된다.
인식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명상이며 수행인 것이다.
좋은 생각의 틀은 강화시켜 나아가고 좋지 않은 생각의 틀은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만족과 행복은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내재 되어 있었던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