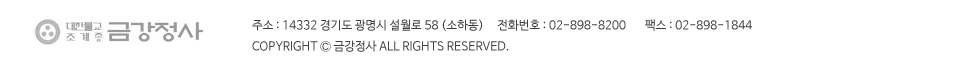3월 둘째주 일요법회(3/9,일)
본문
3월 둘째주 일요법회가 열반재일 기념법회를 겸해 3월9일(일)
총무원 기획국장 석두스님의 법문으로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일요법회에 오신 모두에게 희유하고 희유하신 분들이라 칭찬(?)의 말씀으로 시작한
석두스님의 법문영상은 금강정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htEPEj5jimQ (클릭하시면 법문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날을 기념하는 열반재일은 돌아오는 3월14일(금) 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가피봉사 및 공양실 봉사(문수2구)-


둘은 하나와 하나의 합이다.
총무원 기획국장 석두스님
일공동양(一空同兩)하야 - 하나의 공은 둘과 같아서
제함만상(齊含萬象)이니라. - 삼라만상을 가지런히 포함함이라.
불견정추(不見精麤)이면 - 세밀하고 거친 것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영유편당(寧有偏黨)이겠는가 -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1은 1이고, 2는 2입니다.
1은 절대적으로 2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입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일 뿐 입니다. 개별적인 개체로 본다면 나와 당신은 별개로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옳은 관점처럼 보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2는 1과 1이 더해져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숫자2 속에는 숫자1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2이지만, 내면적으로는 1과 1의 합이 2인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은 2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1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 상에 보이는 다양하고 화려한 화면도 사실은 숫자 1과 0의 조합일 뿐입니다. 컴퓨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장엄한 풍경이 1과 0의 조합이라고 말해도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존재해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입니다. 불교에서 공(空)이란 개념은 비어있는 진공(眞空)이 아닙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의 삼라만상은 모두가 독립적으로 아름답게 어울려 보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나는 육근 중에서 안근을 통해 색계인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알아차립니다. 일반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벚꽃은 나와는 별개로 밖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해보면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나와 대상을 분리한 상태에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같이 의존하여 인식되기에 여기 지금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와 대상을 하나의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세상이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사적으로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원효대사입니다.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은 화회(和會)와 회통(會通)의 논리체계를 말합니다.
위도자영시만경(爲道者永息萬境)하니, 수환일심지원(遂還一心之原)이니라.
“도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만 가지 경계를 길이 쉬어, 드디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될 때 주체와 객체의 분별이나 다툼이 사라진 ‘화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심’이란 차별심이 사라진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분석과 통일 또는 긍정과 부정의 어느 한 측면에서 정의하길 지양하고, 객관적인 논리에 근거해 총합과 회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화쟁사상의 근본원리는 극단을 버리고 화(和)와 쟁(諍)의 양면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합니다.
‘화쟁’이란 말 자체가 원효대사의 고유용어로서 내가 옳다면 상대방도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면 나도 그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시개비(皆是皆非), 쌍차쌍조(雙遮雙照)로서, 모든 대립적인 이론들은 결국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시 긍정과 동시 부정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화쟁의 입장입니다. 자기만 옳다는 아집과 집착을 버릴 때 쟁론이 해소됩니다. ‘화쟁’은 실상(진실, 진리)을 드러내어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쟁론에서 인간세계의 ‘화와 쟁’이라는 이면성을 인정하면서, 화와 쟁은 정(正)과 반(反)에 집착하고 타협하는 합(合)이 아니라, 정과 반이 대립할 때 돌이켜 정과 반이 가지고 있는 근원을 꿰뚫어보아, 이 둘이 불이(不二)라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쟁과 화를 동화시켜 나가는 불이사상 원리를 화쟁사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쟁과 갈등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나, 분쟁과 갈등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에너지나 기회 또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녹여 하나로 만들다거나 다른 하나를 종식시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화쟁은 상대방의 옳음을 발견하는 과정이 됩니다. 논쟁의 대상을 좋은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금 혼란의 가치관 충돌시기에 더욱더 불교적 해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