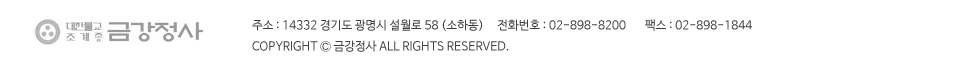11월 호법법회(11/3,수)
본문
짙은 가을향기가 익어가는 11월 첫째주 수요일 아침, “청정사찰 실천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1월 호법법회를 봉행합니다.
중앙승가대 수행관장 동명스님께서 [ 영화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이라는 주제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불자의 문화생활에 대해 법문해 주셨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불자님께서는 동명스님께서 법문하신 좋은 말씀을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법문을 통하여 함께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_()_
동명스님의 온라인 동영상 법문 : https://youtu.be/VPADMbBWYCE

- 동명스님과 함께 하는 호법법회 -

- 불기 2565(2021)년 11월 호법법회를 봉행합니다 -

- 두손 모아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

-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

- 스님들의 축원 -

- 중앙승가대 수행관장 동명스님의 법문 -

영화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중앙승가대 수행관장 동명스님
오늘은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거나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자의 문화생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자의 문화생활은 한마디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를 수행한다는 것은 곧 계(戒)・정(定)・혜(慧), 3학(學)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자의 문화생활은 계정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랏말싸미]는 도입 부분의 자막이 말해주듯 “훈민정음의 다양한 창제설 가운데 하나를 영화로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글 창제에 혜각존자 신미(信眉)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에 입각하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마리를 좀체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대왕은 새 문자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던 서적을 폭우 속에 던져버립니다. 고뇌하는 대왕을 본 소헌왕후가 대자암의 함허득통선사를 찾아갑니다. 함허득통선사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신미대사입니다.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세종대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쉬운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신미대사는 서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궁궐에서, 또는 멀리 법주사 복천암에서 신미대사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정리하고, 이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정리합니다. 그 문자를 유학자인 대신들이 줄기차게 반대하지만, 신미대사를 비롯한 스님들의 이름을 빼고 유학자들의 이름으로 훈민정음을 반포(1446)하게 됩니다. 이상의 줄거리가 이 영화의 뼈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임금의 애민정신과 스님의 보살정신이 결합한 지극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불자들은, 사리사욕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왕과 스님의 마음 속에서 탐욕에 빠지지 않는 계학을 배울 수 있고, 오직 새 문자 창제에 집중하는 왕과 스님들을 통해 정학을 배울 수 있고, 문자의 원리 속에 세상 이치가 들어 있음을 자연스레 배우게 되니 혜학도 증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줄거리가 영화의 전부가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주목하는 인물은 당연히 신미대사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그려진 신미대사의 언행이 불자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신미대사는 까칠하고 오만한 지식인으로, 세종대왕은 유약하고 섬세하고 정 많은 지식인으로 그려집니다. 아마도 통념 속의 인물형을 싫어하는 감독이 세간의 일반적인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기존의 인물형을 뒤집어서 그려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지식인형은 도를 많이 닦은 스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은 갖고 있을지언정, 오만은 불자들이 경계하는 번뇌의 일종이니까요.
신미대사는 주지하다시피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선사의 수제자입니다. 함허선사는 [현정론(顯正論)]과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를 쓴 분으로서, 유불선(儒佛仙) 삼교의 회통과 보살사상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신미대사도 함허선사의 제자로서 유불선의 원만한 회통과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살의 마음을 중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신미스님이 뛰어난 학식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원만한 겸손한 인물이며, 자신의 공로를 굳이 내세우지 않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 신미대사의 언행은 불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면이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에서는 생략하고 직접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찬주의 소설 [천강에 비친 달](작가정신, 2019)에서도 그렇게 그려졌듯이 신미대사는 필시 한글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미대사는 한글이 창제되고 유포됨으로써, 백성들에게 어렵게만 보이는 불교경전이 쉽게 읽힐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며, 자신의 공로를 세상에 알리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유학자들이 훈민정음 반포에 협조할 것이고, 새 문자의 활용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 또는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 협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개인이기주의는 물론 집단이기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진정 만생명에게 이로운 길을 찾겠습니다.(계)
둘째, 만백성에게 이로운 길을 찾겠다는 원력을 세웠으면,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집중하겠습니다.(정)
셋째,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이에게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배우겠습니다.(혜)
넷째, 만생명에게 이로운 일을 한 후에는 내가 공헌했다는 상을 내지 않겠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독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화 감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자의 입장에서는 수행입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문화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보람있는 나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
경전만 보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듯/ 좌선만 고집함도 헛된 노력이라.
가을 하늘이 바다처럼 맑을 때/ 마땅히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看經非實悟 守黙也徒勞 秋天淡如海 須是月輪孤
-청매인오(靑梅印悟, 1548~1623),[의천 선자에게(贈義天禪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