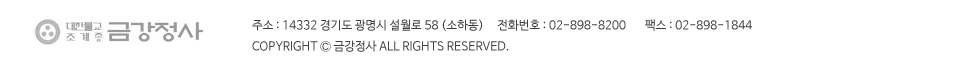1월 둘째주 일요법회(1/10,일)
본문
한파주의보에 한강이 얼어붙은 겨울아침, 1월 둘째주 일요법회가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스님을 모시고 봉행되었습니다.
"눈을 쓰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쓸고 닦는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된다”며 겨울의 장점으로 시작하신 법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위의 복과 무위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던 새해 인사나 덕담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시지 못해 현주스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신 분들은 법회보 또는 유튜브로 꼭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_()_
현주스님 동영상 법문 https://youtu.be/4BVxyZACqZg (클릭하시면 법문으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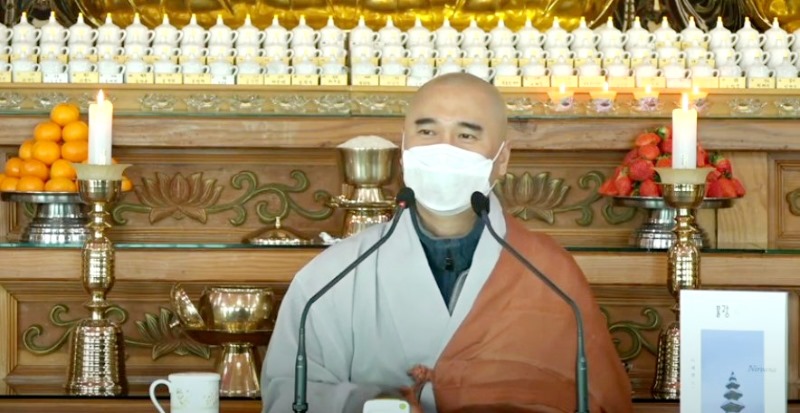
- 1월 둘째주 일요법회 :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스님 -

- 마하반야바라밀 -

- 스님의 법문에 "아하!"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

- 법문 : 유위(有爲)의 복과 무위(無爲)의 복 -

유위(有爲)의 복과 무위(無爲)의 복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스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엔 새해 인사를 연하장으로 주고받았는데요, 요즘은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연하장 이미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찰에서도 불자들이 새해 인사를 할 때 2021년이라는 서기를 쓴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세계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에서 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공문서에서도 모두 서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도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565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사찰에서만큼은 불기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절에서 새해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올해로 2021년이 되었는데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퇴마, 언약, 면죄부, 반석, 이레, 은총 등의 용어들은 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젊은 계층에게서 불교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 장로, 포교, 전도, 예배, 기도 등은 원래 불교 용어인데 기독교에서 자신들만의 언어인 양 쓰고 있습니다.
언어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주 쓰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거나, 그 뜻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마저 부처님 기준의 시간 단위인 불기를 외면하게 되면 안됩니다. 불자들은 불기를 사용함으로써 2565년 전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고 싶고, 짓고 싶은 복은 어떤 복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죠.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독인 탐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일 리가 없겠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덕담으로 주고받는 새해의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금강경]의 제 11 「무위복승분」(無爲福勝分)에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2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유위(有爲)의 복과 무위(無爲)의 복입니다.
유위의 복은 물질적인 보시입니다. 유위의 복으로 선업을 쌓는다면 그 과보로 많은 물질적인 복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언젠가 소멸하는 다함이 있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위의 복은 어떨까요? [금강경]에서는 경전의 사구게 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설해 주는 복이 바로 무위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금강경]의 요체인 ‘무아’ 즉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지혜를 닦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집착없이 보시를 할 수 있으며,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을 특별히 공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금강정사 불자님들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라 “새해에는 공덕을 많이 지으세요”라고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공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무위의 복입니다. 무위복의 과보는 불가사의하고, 업장을 맑게 해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