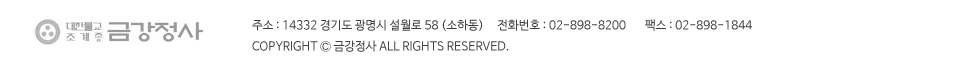10월 셋째주 일요 현주스님 초청법회및 지장재일(10/20,일)
본문
올들어 가장 기온이 내려간 다소 쌀쌀한 일요일 입니다.
오늘은 음력 9월 지장재일이라 천수경-상단불공~정근 및 축원-반야심경 후 현주스님 초청법문이 있었습니다. "청정한 공덕을 담는 발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간결한 법문을 해 주십니다. 최초의 발우는 사천왕이 올린 돌 발우라는걸 오늘에야 처음으로 안 저 또한 많은 공부를 해야겠단 생각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행을 하며, 화려하지않으며 누추하지도 않게 하는게 석(石) 발우의 정신이라고 하십니다. 청정한 발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 입니다.
현주스님 법문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hzgHDCrqicc








- 보현구 공양봉사 -

청정한 공덕을 담는 발우가 됩시다.
현주스님
음식 먹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 한다”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산다”는 우스개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일’은 우리 중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살아야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님도 수행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먹어야만 기력을 돋구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과 수행자의 식사는 세간의 식사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게 음식 올리는 것을 ‘공양(供養)’이라 하고, 공양받을 만한 수행자를 ‘응공(應供)’이라 부릅니다.그리고 사찰에서 음식 먹는 것도 ‘공양한다’고 표현하며, 먹는 음식을 ‘공양’으로 부릅니다.
‘공양’은 본래 산스크리트어인 ‘푸자나(pujana)’의 번역입니다. 공시(供施) 혹은 공급(供給)으로 한역되며, 줄여서 ‘공(供)’이라고도 합니다. 인도의 고대 종교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신에게 바치던 ‘공희의식(供犧儀式)’을 행했는데 불교가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동물을 희생시키는 의식을 금하고, 삼보에게 청정한 공양물을 올리는 형식으로 새롭게 변용시켰습니다.
‘공양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양물을 담을 수 있는 ‘발우(鉢盂)’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공양물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발우’가 주목됩니다.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께서 ‘첫 공양’할 때 발우가 탄생되었습니다.부처님께서 첫 공양하던 그 사건은 –과거현재인과경- 3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리카와 타풋사라는 두 상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계신 곳 부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천신이 말했습니다.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대들은 맨 먼저 공양을 베풀지니라.” 그래서 상인들은 “말씀대로 하겠다”며 부처님을 찾아 꿀과 미숫가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보시고 나서 “과거의 부처님들은 발우에 음식을 담아 드셨는데 지금의 나에게는 발우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저마다 돌로 만든 발우 하나씩을 받들어 올렸습니다. 사천왕이 바친 돌로 만든 발우에 공양을 받으신 부처님은 축원했습니다. “지금 보시를 하는 것은 먹는 이가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함이니, 장차 보시하는 자는 좋은 빛깔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 편안하고 상쾌하며 병이 없이 마침내 오래 살게 하리라.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받들고 가까이 하여, 미묘한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를 보며 깨달음을 얻어, 원한 바가 완전히 갖춰지리라.” 축원을 마친 부처님은 음식을 드시고 양치질 하고 발우를 씻은 뒤 즉시 상인들에게 첫째 부처님께 귀의하고, 둘째 법에 귀의하며, 셋째 장래의 승가에 귀의하는 삼귀의계(三歸依戒)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발우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속에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佛性)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불성에 올리는 공양은 공덕과 지혜이고, 공덕과 지혜를 담는 공양구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업에 물들어 있다면 청정한 공덕과 지혜를 담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청정한 발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한 마음을 닦는 수행인 사무량심(四無量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라는 문수보살의 게송 또한 우리가 청정한 발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