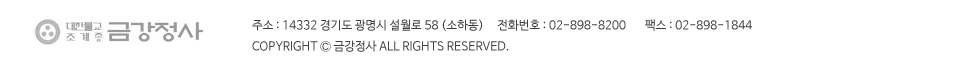9월 둘째주 일요법회(9/8,일)
본문
오늘은 9월 둘째주 일요법회일입니다.
추석전 벌초 하러가셨는지 법당이 휑하니 비었네요.
중앙종회의원이신 가섭스님께서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원여행 “ 열일곱번째 시간으로
나무(南無)와 보살마하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무는 예경의 의미이며, 귀의는 기댄다는 뜻으로 돌아갈 곳이란 뜻입니다.
보살은 지혜와 덕을 갖추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분으로 마음을 크게 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12분의 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관세음보살의 또다른 이름이라고 하네요. 항상 유쾌하시며 쉽게 비유 설명해 주시는 가섭스님 감사합니다.
가섭스님의 법문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59t8bWRaJTQ





- 발원문: 수도권구 은성보살님 -


- 공양봉사: 문수2구-

- 가피봉사: 자성화.원만행보살님 -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원여행 17
중앙종회의원 中耕 가섭스님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 대위력의 대세지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천수보살마하살 / 천 개의 손을 가진 천수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여의륜보살마하살 / 법 바퀴를 굴리는 여의륜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대륜보살마하살 / 큰 바퀴를 굴리는 대륜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관자재보살마하살 / 지혜의 관자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정취보살마하살 / 바른길로 이끄는 정취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만월보살마하살 / 보름달과 같은 만월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수월보살마하살 / 온갖 곳에 나투시는 수월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군다리보살마하살 / 감로수를 주시는 군다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십일면보살마하살 / 11가지 모습의 십일면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제대보살마하살 / 위대한 보살인 제대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본사아미타불 (3번) / 근본 스승이신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오늘은 천수다라니경의 10원 6향을 마치고 지극한 마음으로 12보살명호를 부르고 그 보살의 본사(本師)이신 아미타부처님을 오로지 생각하고 부르는 칭명염불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2분의 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중심으로 천수, 여의륜, 대륜, 관자재, 정취, 만월, 수월, 군다리, 십일면보살을 말합니다. 모두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무(南無)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마스(namas)의 음역입니다. 인도나 네팔에서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볼 때 예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귀의(歸依)’란 용어는 주로 산스크리트어 삼귀의의 ‘buddham saranam gacchami’(나는 부처님이라는 피난처에 가까이 다가갑니다)를 주로 ‘귀의’라고 번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arana은 전쟁이나 전투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즉 화살이 비오듯 쏱아지는 전쟁터에서 피난처(shelter)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숨을 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sara’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화)'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nam’은 등을 돌린다 즉 피한다는 뜻입니다. 귀의는 구제(救濟) 또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하살은 마하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보살은 보리살타(菩提薩埵)로 Bodhisattve(보디사트바)의 음역으로 각유정(覺有情) 개사(開士) 대사(大士) 대심중생(大心衆生)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보살마하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깨달음을 향해가는 보살, 중생을 향해가는 보살, 그 분의 삶이 중생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위대하므로 ‘보살마하살’이라고 하여 우리들의 신앙심을 정서적 차원에까지 내면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스스로는 자기 마음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발심한 보살은 그 마음을 스스로 크게 가집니다. 여기서 발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심이 본래 청정하며, 모든 덕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들을 대심범부(大心凡夫)라고 하는데 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스로 본래부처임을 믿는 것은 대승의 기신(起信)이라 하고 스스로 본래 붇다임을 믿는 것을 선문(禪門)의 돈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무(南無)는 타자에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에의 귀명(歸命)인 것입니다.
자기에의 귀명만이 ‘보살마하살’에 대한 보살마하살의 참된 귀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의 귀의(自歸依)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마하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