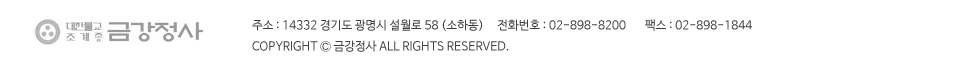선지식법회(6월24일)
본문
‘호국의 달’에 생각하는 불교
김경집 / 위덕대 겸임교수
6월은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인 현충일이 있어 호국의 달로 불리고 있다.
많은 침입을 겪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성한 국력이 우선이었다. 불교 역시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호국의 이념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국가관이 확실한 불교는 국가의 안녕과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설해왔다.
옛날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지도자는 국가의 재난방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 그래서 기근이나 자연적 재해가 발생하면 신하와 함께 궁전에서 경을 읽고 마음을 근신하여 재난이 물러가도록 기원하였다.
불교문화가 국민적 사상으로 자리하고 있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배불정책으로 일관되었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군왕들은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불교적 행사를 거행했음이 역사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그것이 鎭護國家佛事이다.
한국불교 속에 나타난 진호국가 불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험과 역경에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함께 진호국가 불사에는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옛날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민심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민심은 아주 예민하여 조그만 일에도 금방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작은 피해가 오면 그 즉시 등을 돌린다. 이 같은 민심이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나 국가에 대해 그들이 신명을 바쳐 헌신하지는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민심의 화합을 위해 진호국가불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부단히 행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