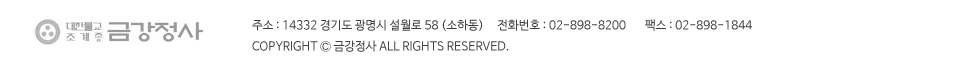선지식법회(7월 22일)
본문
백중기도의 의미
법문 : 남전스님
요즘 절마다 백중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중하면 영가천도를 떠올리시는 불자님들이 많지요. 대부분 백중날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백중에 영가천도를 왜 하게 되었는지 대해 생각해 보면, 백중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수행의 공덕이 가득한 스님들, 목련존자의 효행, 시방세계 모든 인연들에 공덕을 회향하는 등등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효행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효(孝)하면 유교(儒敎)가 떠오릅니다. <논어(論語)>를 비롯한 사서삼경(四書三經) 같은 유교의 주요한 경전들이 모두 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자(曾子)가 편찬한 <효경(孝經)>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출세간(出世間)적인 종교로 이해합니다. 수행자의 출가(出家)와 세속에서 벗어난 수행환경 같은 불교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나 열반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불교의 출세간적인 경향은 세간적인 효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불교의 효가 유교의 배불론(拜佛論)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朝鮮)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는 논리로, 부모와 임금도 모르는 무뢰배라는 뜻의 “무부무군지도(無父無君之道)”를 내세워 배불론을 폈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불교는 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모든 경전마다 나타납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大乘)경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율장(律藏)에서도 효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유교에 대한 대응이나 세간적인 거리감보다는 불교가 고유의 가르침으로 효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불교는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불교는 현실적인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중요한 교리는 모두 인간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효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서 본다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불교는 효를 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선 유교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효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반면, 불교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은(報恩)의 행위가 바로 효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을 보더라도 어버이의 자애(慈愛)에 대한 설명이 효에 관한 언급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애가 그대로 자식에게 통하는 곳에 효도로써 봉양(奉養)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효행을 통해 살아 계신 부모를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고, 사후에는 극락왕생해 다시는 생사(生死)의 길에 들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효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있어 유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중에 모시는 영가를 위한 기도와 천도는,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부모와 조상의 은덕과 우리의 효행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 깊은 날이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